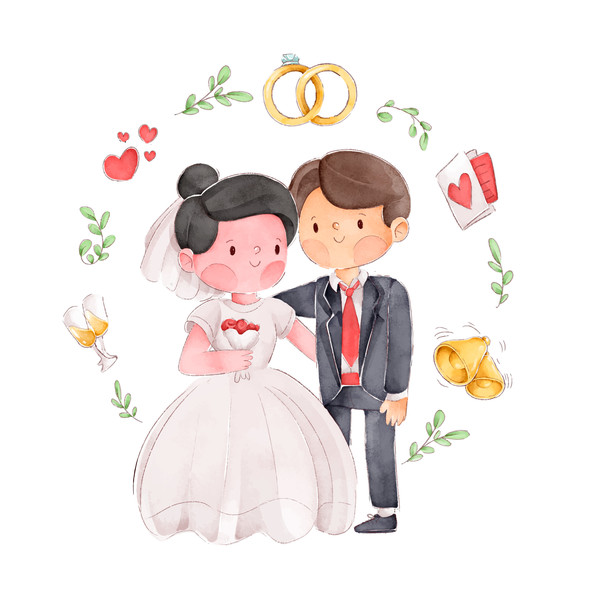
며칠 전 친지 아들 결혼식장에서의 일이다. 결혼식이 시작되어 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양가 부모는 앞에 앉았지만, 주례는 보이지 않는데도 신랑·신부가 손을 맞잡고 입장을 하였다. 근래에 유행하는 주례 없이 양가 부모 대표가 나와 인사를 하고, 신랑·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결혼식을 거행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신랑·신부가 바로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혼인 서약문을 낭독하고, 신랑·신부 우인들의 축가가 이어진 후 단체사진을 찍고는 끝이었다. 축가 시간을 제외하고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40여 년 전 필자의 결혼식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40여 년 전에도 결혼식이 지금처럼 결혼식장에서 성행할 때 필자는 전통혼례에 따라 거행했다. 8남매 마지막 결혼이라는 점도 고려됐지만,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을 결혼식장에서 무엇에 쫓기 듯 2~3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전에 함진아비를 보내고, 결혼 당일에 우인들과 함께 신붓집으로 가서 사모관대를 쓴 후 홀기(笏記)를 부르는 대로 결혼식을 거행했다. 결혼식 날 밤에는 신랑 방을 꾸려 동네 청장년들과 술상을 차려놓고 노래를 부르며 보냈다. 다음 날에는 동네 청장년들에게서 “여기에 뭐 하러 왔느냐?”, “처녀 훔치려 온 도둑 아니냐?”며 발바닥을 다듬이로 맞기도 하고,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는 등 신랑 다루기를 받으며 지냈다. 그리고 삼일신행(三日新行) 후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전통혼례였다.
혼례는 인생의 통과의례(通過儀禮)인 관혼상제(冠婚喪祭)의 하나로 성장한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의식이다. 우리나라 혼례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이다. 상고 시대의 혼례풍습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고조선의 부여에서는 일부일처제였지만, 가계(家系)를 중요시하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가 있었고, 동옥저에서는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리던 일종의 매매혼 제도인 민며느리제도가 있었다.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 고구려 시대에는 모계 중심 사회의 풍습으로 사위가 신부의 집 뒤뜰에 마련한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에서 거처하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서옥(壻屋)제도, 즉 우리말로 데릴사위제도도 있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도를 확립하여 왕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족 간의 혈족 혼인이 있었다. 또 백제 시대에는 부녀자의 정조가 요구되는 일부일처제가 정립되었는데, 신라나 고구려에서보다 일찍 혼례풍습이 정립된 듯하다.
삼국통일 이후 고려 초기에서도 계급적 내혼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근친혼이 성행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충선왕(1310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친과 양반의 동성 금혼(同姓禁婚)을 국법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또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당할 때에는 고려여인들을 공녀로 데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 남자를 신붓집에서 양육하여 장성하면 혼인시키는 예서혼의 풍습이 있었고, 혼인한 여자들은 공녀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다처(一夫多妻) 제도도 있었다.
혼례가 보다 체계화하고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다. 이 혼인제도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통혼례라 할 수 있다. 남녀유별이 심했던 조선의 혼례는 결혼 당사자보다 가문을 더 중요시했고, 시일도 오래 걸리며 절차도 복잡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례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자식을 결혼시킨 후 빚더미에 앉는 집이 많았다. 그러다가 1890년대에 들어서며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 개신교 등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생긴 혼례가‘예배당 결혼’으로, 소위 말하는‘신식결혼’의 시발점이다. 그러다 보니 전통혼례는 자연히‘구식결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에는 신식 결혼을 흔히‘사회결혼(社會結婚)’이라고 불렀는데 192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결혼 수요가 더욱 급증하자 지금의‘예식장’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혼례복을 빌려 주는 가게와 신부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장원도 생겨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예식장도 이제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문화가 확산되면서 예식장은 물론 결혼상담소, 산부인과 등 결혼·출산 관련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비혼식(非婚式)’을 공공연히 개최하고 있다니 그럴 만도 하다.
어쨌든 최근의 결혼식은 전부라 할 정도로 신식결혼식으로 바뀌었지만, 어쩌다 결혼식 후 폐백실에서 양가 부모·형제들이 조촐히 치르는 폐백에서나마 겨우 전통혼례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풍습이나 문화는 시대에 따라 늘 변하게 마련이지만, 가끔은 옛 풍습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문화는 찬란히 꽃피지 않을까.
=하종덕(전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